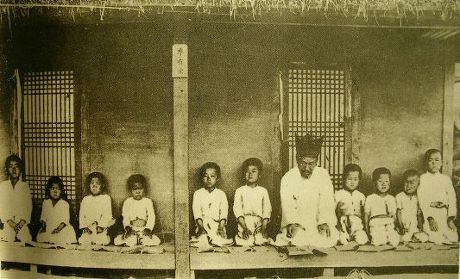여항시인들의 시선집인 「풍요속선(風謠續選)」에는 이상조를 두고 ‘파리한 모습에 손가락이 길었다’라고 묘사했고, 제자였던 우선 이상적은 ‘총기가 세상에 뛰어나, 한 번 보면 잊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스승 이용휴는 제자의 유고집 서문에서 이렇게 평했다. “생각이 현묘한 지경까지 미쳤으며, 먹을 금처럼 아꼈고, 문구 다듬기를 마치 도가에서 단약(丹藥)을 만들 듯했다. 붓이 한 번 종이에 닿으면 전할 만한 글이 되었다. 남보다 뛰어나기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다.” 먹을 금처럼 아꼈다는 말은 시를 쓰면서 그 표현에 꼭 필요한 글자만 썼다는 뜻이고, 단약을 만들 듯했다는 말은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 여러 번 갈고 닦았다는 뜻이다. 그는 타고난 천재일 뿐만 아니라 노력하는 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