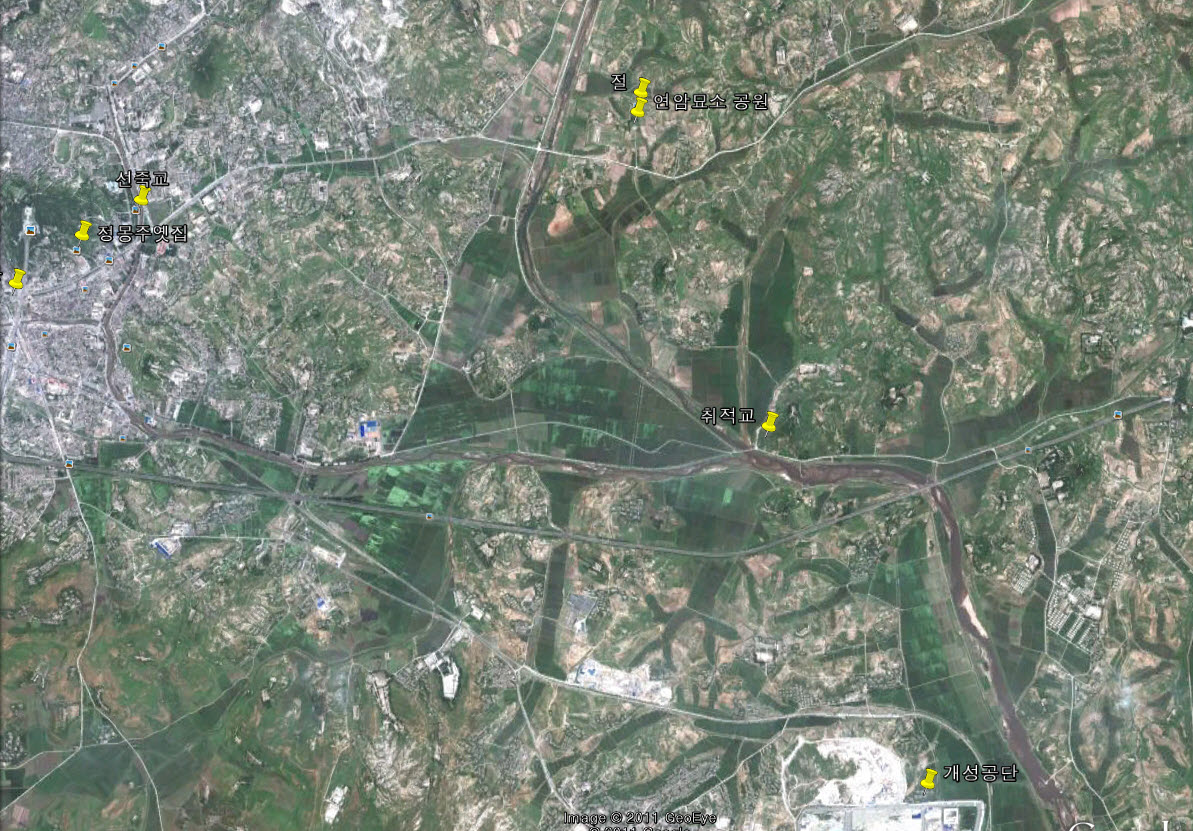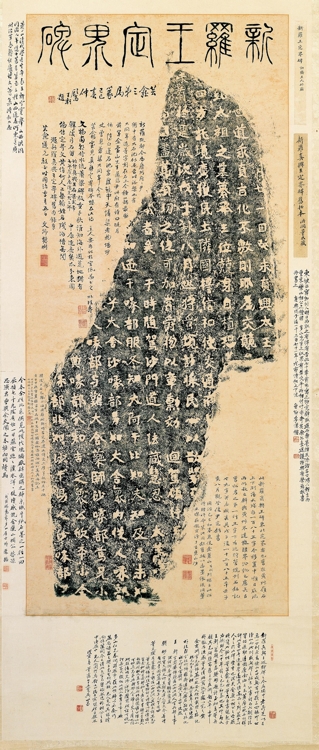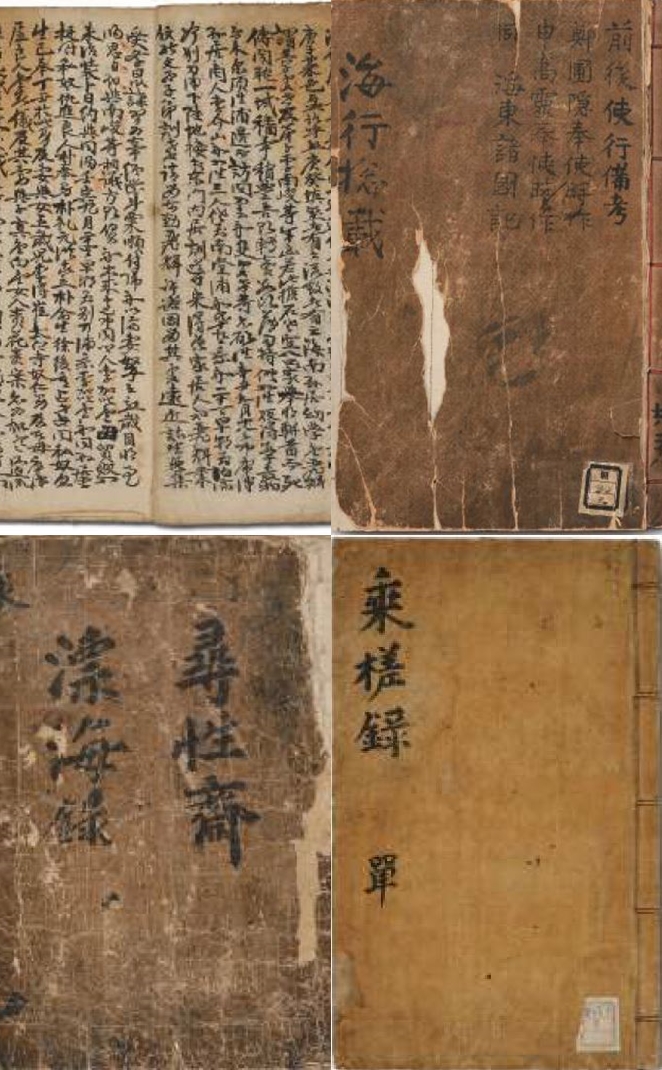[<조선의 관리와 서기> 영국 선박 알세스트(Alceste)호의 선의였던 맥레오드가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겪은 일을 써서 1818년에 펴낸 『알세스트호 항해기(Voyage of the Alceste to Lewchew)』에 실려 있는 삽화. 1816년 9월 4일과 5일, 영국의 Alceste호(함장 Murry Maxwell)와 Lyra호(함장 Basil Hall)가 청나라 방문 후 조선의 서해안을 탐사하던 중 충남 서천군 비인현 마량진에 정박한 일이 있었다. 이때 조사를 위해 배에 오른 마량진 첨사 조대복과 비인현감 이승렬 일행을 그린 것이다. 긴 담뱃대를 들고 큰 갓을 쓴 조선 관리를 묘사하였지만, 얼굴 생김은 서양사람아다.] 주변에서 박지원을 위하는 마음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공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