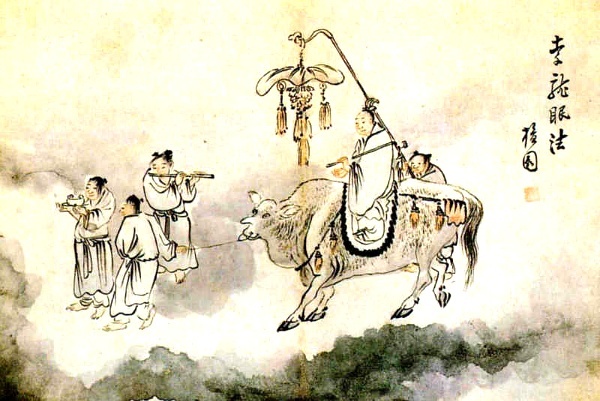아버지는 금강산을 유람하실 때 라는 시를 한 수 지으셨다. 판서 홍상한(洪象漢)1이 아들 집에서 그 시를 보고 놀라면서 말하기를, “지금 세상에도 이런 필력이 있었던가? 이는 거저 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중국 붓 크고 작은 것 2백 개를 문객(門客)으로 하여금 갖다 주게 하여 정중한 뜻을 표하였다. 「과정록」 라는 시는 ≪연암집≫에 실려 있지만 ≪열하일기≫에도 실려 있다. 연행 길에 동행들이 청돈대(靑墩臺)에 해 뜨는 구경을 가자고 청해왔지만 박지원은 조용히 잠을 자기 위해 사양하였다고 적었다. 그리고는 예전 총석정에서 해돋이 구경을 하고 지은 시라며 이 시를 실었다. 박지원 자신도 꽤 잘 지은 시라 자부했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7언 70구(句)로 된 이 한시(漢詩)는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